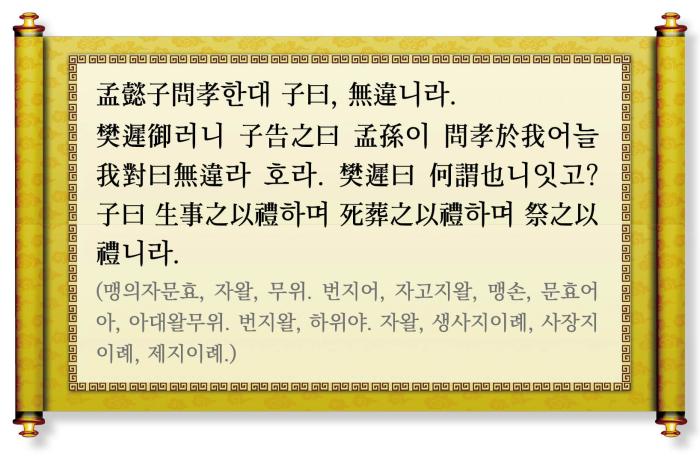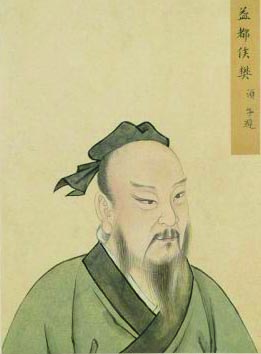맹의자가 효에 대해 묻자,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다.
“효란 어기지 않는 것이다.”
번지가 선생님을 모시고 수레를 몰고 가는데, 선생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에 대해 묻기에 내가 ‘어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이에 번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에는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는 절차를 예에 맞게 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도 예에 맞게 지내라는 뜻이었다.”
▶직역
孟懿子問孝(맹의자문효) 맹의자가 효를 물으니, 子曰(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無違(무위) 어기지 않는 것이다.”
樊遲御(번지어) 번지가 수레를 모는데, 子告之曰(자고지왈) 선생님께서 그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孟孫問孝於我(맹손문효어아)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묻거늘 我對曰無違(아대왈무위) 내가 ‘어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樊遲曰(번지왈) 번지가 말하였다. “何謂也(하위야)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子曰(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生事之以禮(생사지이례) 살아 계실 때에는 예로써 섬기고, 死葬之以禮(사장지이례) 돌아가셨을 때에는 예로써 장사지내며 祭之以禮(제지이례) 예로써 제사지내는 것이다.”
▶해설
○孟懿子: 노나라의 대부 중손씨(仲孫氏). 이름은 하기(何忌), 시호는 의(懿). ‘孟’은 중손라는 성의 같은 항렬에서 맏이라는 뜻이고, ‘懿’는 그의 시호, ‘子’는 남자의 미칭. 맹희자(孟僖子)의 아들.
○無違: 어기지 아니하다
△無: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 ‘不’과 같다.
○樊遲: 공자의 제자. 이름은 수(須), 자는 자지(子遲). 제(齊)나라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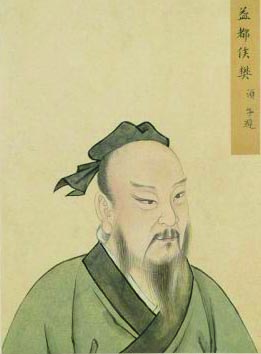 |
| 번지(번수) |
○樊遲御: 번지가 수레를 몰다
△御: 동사로 ‘수레 몰다’.
○孟孫: 맹의자. 맹의자가 중손씨의 맏이란 뜻에서 그를 일컬은 말.
○何謂也: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의문대사 ‘何’가 동사 앞으로 도치된 형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대사를 빈어로 취할 경우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도치시킨다.(1-16 不患人之不己知 참조)
△也: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生事之以禮: 살아 계실 때에는 예로써 그들을 섬기다
△事: 동사로서 ‘섬기다’의 뜻. △之: ‘어버이’를 가리키는 인칭대사. △以: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개사.
글쓴이: 김인서(민들레피앤씨 대표)